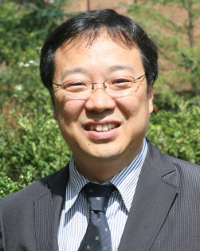
새해가 밝았으나 한국 사회의 전망은 어둡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오늘날 인구 정책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일까. 생산자, 소비자, 연금 납부자가 될 미래의 인적 자원 증가인가? 노동력과 노동에서 파생될 경제력인가? 한국 사회의 여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도 결국 ‘사업’이 아닌 ‘사람’이 관건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리와 정책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노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존재는 비하한 발언인데, ‘돈만 주면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식의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변하고 있다. 가령 대표적 노동자인 임금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다. 최근에는 신조어들이 계속 나온다. ‘저임금에도 소비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consumtariat), ‘위험한 일은 도맡아 하는 프롤레타리아’(precariat) 등이다. 주목할 점은 프롤레타리아가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를 거치면서 단어 함의가 변하고 의식과 행동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원래 전근대 즉 고대에서 나왔다. 로마 공화정은 시민 중심 사회로, 시민은 재산에 따라 분류됐는데 최저 재산 이하를 소유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다. 이 단어 뜻은 ‘재산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자식뿐이다’, 곧 ‘무산유자계급(無産有子階級)’이다. 이는 근대에 산업사회 임금노동자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재등장했다. 그러나 당대 사회는 임금노동자의 ‘노동자’보다 ‘임금’만 중시했고,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사회적으로 노동운동 등장,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대두, 자본주의 복지 도입 등이 이뤄졌다.
후기근대의 상황은 어떤가. 후기근대사회 시민은 역사에서 인권 확산과 생활 개선을 배웠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현실을 실시간 접하며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의식하게 됐다.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아니면 생활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노숙과 자살이 증가한다. 세계적으로도 영국 ‘차브’, 일본 ‘히키코모리’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중·후진국 출신 이민자도 선진국 입국 후 생활 압력으로 저출산 대열에 동참한다. 즉 후기근대사회의 신(新)프롤레타리아는 무산유자계급이 아닌 ‘무산무자계급(無産無子階級)’이 되고 있다.
동물도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이랴. 경제가 중요해도 경제를 위해 사람을 낳을 수는 없다.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낳고 행복을 위해 태어나야 한다. 인류는 본능이나 잘못된 전통으로 출산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살아야 할 이유, 살고 싶은 이유가 있는 사회 조성이 출발이다. 그런 사회는 단순한 혜택 제공보다 인간 존중 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만성적 재난사회로 전락하고 생명 경시가 판을 친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직면하는 것은 배려는커녕 무시, 억압, 위협이다.
교회력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3일 후인 12월 28일에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Holy Innocents Martyrs; Childermas)이 있다. 헤롯이 예수 탄생을 정적(政敵)의 등장으로 여겨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 모든 사내아이를 살해했는데, 이들을 첫 번째 순교자로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가 태어난 세상이 그렇게 살벌한 세상이었다. 그동안 교회는 산아 제한(개신교), 낙태 반대(가톨릭)에 힘쓰면서 ‘태어난 생명’보다 ‘태어나기 전 생명’에 더 관심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경제 논리로 저출산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생명 경시 노선을 벗지 못하는 사회의 모순적 여론몰이에 교회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번성하라’는 축복 교리는 아무 데나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안교성(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역사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