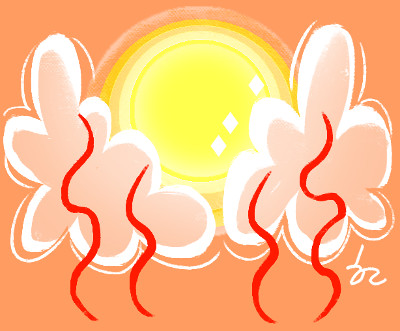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서울보다 높은 위도에 위치한 미국 시카고의 1995년 7월 기온은 40도에 달했다. 체감온도는 48도에 육박했다.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결국 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79년부터 92년까지 13년간 열사병으로 자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5379명이었다. 매년 한 해 평균 41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카고의 폭염으로 숨진 700명은 재앙에 가까운 숫자다.
1년이 지난 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한 맞춤 대처로 4년 뒤 비슷한 폭염에선 사망자를 110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한 덕분이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에릭 클리네버그 교수는 다양한 사회학적 연구로 ‘열파: 시카고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부검(Heat Wave: A Social Autopsy of Disaster in Chicago)’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자연재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다른 사례는 2003년 7월 서유럽을 덮친 살인 폭염이다.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하면서 프랑스에서만 1만4800여명 등 유럽 8개국에서 모두 3만5000여명이 희생당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당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과연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프랑스는 이듬해부터 1년에 걸쳐 폭염을 분석한 뒤 노인보호시스템 개선 방안 등 방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1942년 8월 1일(대구 40.0도) 이후 40도를 찍을 지역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식은 아니지만 24일에는 경북 영천이 40.3도를 기록했다. 40도가 넘으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폭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김준동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