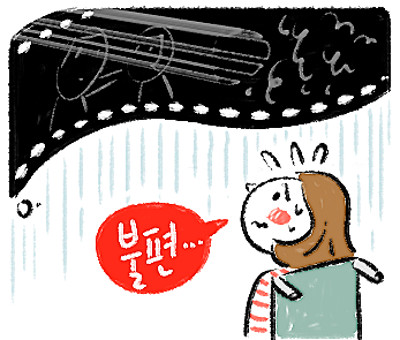
극장에 가는 걸 좋아했다. 기대 가득한 웅성거림과 조도 낮은 조명, 달큼하고 고소한 팝콘 냄새 같은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 공간은 평범한 일상도 조금쯤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관객이 가득 찬 상영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놀라며 영화를 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텅 빈 상영관에서 혼자 스크린을 바라볼 때면 한없이 쓸쓸해졌지만 그 또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공간은 내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순간부터 더할 수 없이 불편한 곳이 되어 버렸다. 상영관의 좌석은 대개 중간부터 차기 시작한다. 매진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맨 앞의 서너 줄은 비어 있게 마련인데, 스크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휠체어 전용좌석은 대부분 객석의 맨 첫 줄보다 한 칸 앞에 외따로 떨어져 있다. 비장애인들도 여간해선 앉지 않으려 하는 자리보다도 앞쪽에 장애인석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런 자리에선 목을 완전히 뒤로 젖히고 바라봐도 스크린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다. 불편함을 참으며 영화를 보고 나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건 물론이고, 등허리와 목이 뻣뻣하게 굳어 사나흘쯤은 심각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로 도배되다시피 한 적이 있다. 누군가의 감상평이 시발점이 되어 너도나도 극장으로 달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난 가볍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극장에 가서 편안히 영화를 보고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다. 아마도 나는 그 영화가 모두의 관심 밖으로 적당히 밀려나고 스포일러도 퍼질 대로 퍼진 후에야 IPTV로 보게 될 것이다. 객석 중앙에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는 외국 극장의 휠체어 전용석 사진을 보고 있자니 부러운 마음과 함께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극장 운영은 물론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에 장애인 이용객이 고통스럽지 않을 만한 휠체어 전용석을 만드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하는.
황시운(소설가)





